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협정은 그동안 글로벌 기후대응 체계 운영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해온 조약인 만큼 실제로 여러 국가가 탈퇴하면 국제 공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3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에 뒤이어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파리협정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리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참여국들이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자고 합의한 조약을 말한다. 매년 열리는 기후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을 대응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20일(현지시각) 취임한 뒤 곧바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자이자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이다. 그런 미국이 국제 기후대응 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이에 몇몇 국가들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파리협정은 준수할 이유가 없다며 탈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리협정 준수 여부에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하심 조요하디꾸수모 인도네시아 기후특사는 이날 열린 콘퍼런스 현장에서 “미국이 국제 합의에 따르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가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만 놓고 봐도 인도네시아는 3톤, 미국은 13톤에 달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실제로 일으킨 피해보다 더 큰 감축 할당량을 부당하게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하심 조요하디꾸수모 인도네시아 기후특사. < Flickr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로 지난해 전체 전력 발전량의 약 66%를 석탄에서 얻었다.
이에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난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전환 노력을 돞기 위해 2022년 일본과 합작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인도네시아에 약 200억 달러(약 29조3680억 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안에는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전환도 돕지 않는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는 국가연합체 ‘아세안(ASEAN)’의 수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국제통계기관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세안 10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은 19억1천만 톤으로 세계 5위 배출국인 브라질보다도 높다. 아세안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면 국제 기후대응 체제도 크게 힘을 잃을 공산이 크다.
조요하디꾸수모 특사는 “미국의 재정 지원 계획은 필연적으로 취소될 것이라 보고 있다”며 “미국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은 사실상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아메리카에서도 파리협정 이탈을 향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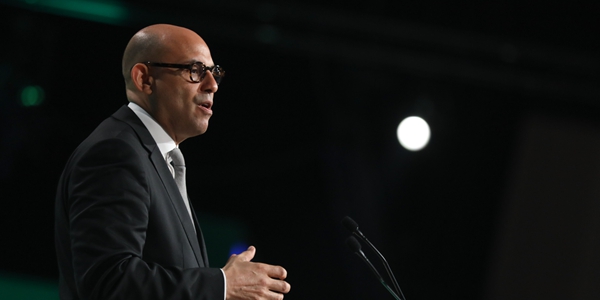
▲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 Flickr >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파리협정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23년에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는 “기후변화는 사회주의적 거짓말”이라고 발언할 정도로 국제 기후대응 협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당시에는 회기 도중에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키기도 했다.
잇따르는 각국의 탈퇴 움직임에 파리협정을 주관하는 국제 기관에서는 직접 수습에 나섰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공식성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전환은 차세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파리협정 재가입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있을 것이고 우리는 모든 국가들과 건설적인 교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KT 이사회 뭇매가 기대를 낳는 이유,](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511/20251106153113_81318.jpg)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 안팎 '찬성'](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2/20260209104958_80899.png)
![[코스피 5천 그늘①] 증시 활황에도 못 웃는 LG그룹, 구광모 '체질 개선'과 '밸류업'으로 저평가 끊나](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2/20260209151542_142553.jpg)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2/20260209174216_17992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