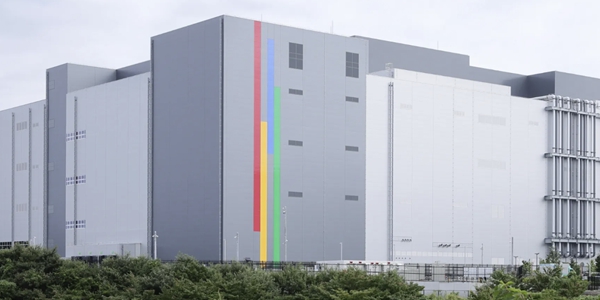
▲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기후재난이 데이터센터 산업에도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일본 치바현 인자이시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 <구글>
데이터센터는 그동안 주로 온실가스를 내뿜게 하는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센터도 기후재난에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상호의존성이니셔티브(XDI)'는 9일 '2025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기후위험 및 적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XDI는 2007년에 설립된 연구 업체로 물리적 자산을 향한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센터들 가운데 기후재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데이터센터 비중은 약 6.25%로 파악됐다. 중위험군 비중은 15.79%였다.
여기서 고위험군이란 데이터센터가 태풍, 해안 침식, 하천 범람, 가뭄, 강풍 등 기후재난을 겪으면 발생할 최대 손실 예상액이 인프라 자산가의 1% 이상인 집단을 말한다.
XDI는 "고위험군 집단은 극단적 기상 및 기후위험으로 인한 인프라 손실 가능성이 커서 보험료가 매우 비싸거나 향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위험군은 손실 예상액이 0.2% 이상 1.0% 미만인 집단으로 중위험군 집단도 기후재난 관련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칼 말론 XDI 창립자는 "글로벌 경제의 소리없는 엔진인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구조가 점점 더 기후재난에 취약해지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자, 투자자,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데이터센터를 다른 자산의 기후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본 그동안의 일반적 분석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기후변화에 피해를 입는 주체로 봤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를테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4월 내놓은 '에너지와 AI' 보고서에서 글로벌 데이터센터 산업이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8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만든다고 예측했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AI산업 경쟁이 격화하면서 향후 10년 내로 약 80%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 동아시아 지역 데이터센터 위험도 평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지도. 붉은색 점은 고위험군 데이터센터, 주황색은 중위험군 데이터센터, 하얀색은 저위험군 데이터센터를 나타낸다. <상호의존성이니셔티브>
탄소 고배출 시나리오 SSP5-8.5를 적용한 분석 결과, 2050년 기준 고위험군 데이터센터는 올해와 비교해 약 14%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3%로 늘게 된다.
중위험군 데이터센터 비중은 기존 15.79%에서 약 24%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주요 지역별 분석 결과 동아시아는 기후재난 위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지역으로 파악됐다.
2050년 기준 동아시아 지역 고위험군 데이터센터 비중은 약 18.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로 따지면 중국 장쑤성이 고위험군 비중이 가장 높아질 곳으로 지목됐다. 2050년 기준 장쑤성에 설치된 데이터센터 25개 가운데 64%는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61.9%), 독일 함부르크(58.3%), 중국 상하이(49.0%), 러시아 모스크바(3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고위험군 비중이 6.1%가 될 것으로 집계돼 이번 보고서가 집계한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 100곳 가운데 46번째로 재난 위협이 높아질 지역으로 분류됐다.
말론 창립자는 "결정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이 없다면 2050년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보험료가 전 세계적으로 3~4배 가량 인상될 정도로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위험도가 시장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다"며 "인프라 복원력을 향한 집중 투자, 물리적 적응, 탈탄소화 노력을 병행해야 데이터센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