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비은행 계열사 자본확충에 속도를 낼까.
우리금융지주는 이자이익이 늘어 연말까지 실적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실적 부담을 덜고 비은행부문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지주 금리인상 효과 더 본다, 손태승 비은행 자본확충 힘싣나]()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3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의 3분기 예상 순이익은 7160억 원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좋은 실적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며 "이자이익 증가가 성장을 지속 견인하는 가운데 대손비용과 판관비 부담이 낮게 유지되며 고수익성 시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효과와 가계대출 억제조치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효과 등이 맞물리며 은행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금리인상 효과에 따른 실적 증가효과를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은행 순이익 기여도는 80%를 넘어선다. 경쟁 금융지주들의 은행 순이익 기여도가 55~65%대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다만 은행의 순이익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금리상승시기에는 강점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구조상 약점으로 꼽힌다.
손 회장은 이를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상황에서 톡톡히 겪었다.
코로나19 상황에 저금리기조가 이어져 이자이익은 감소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해 대손충당금 규모는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지주는 증권 등 비은행계열사를 통해 실적 증가세를 이끌었다.
2019년 대비 2020년 금융지주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하나금융지주는 10.3%, KB금융지주는 4.33%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신한금융지주도 0.3% 늘어나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반면 우리금융지주는 유일하게 순이익이 30% 줄었다. 비은행부문이 부족한 탓이다.
손 회장이 지속해서 우리금융지주의 비은행부문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다. 손 회장은 5일 자회사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기존 비은행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비은행부문을 그룹의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자"고 말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이자이익 증가로 당분간 실적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최우선 과제인 비은행부문 강화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기존에 인수한 계열사들을 금융지주 수준으로 덩치를 키우고 비어있는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메우는 두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인수합병은 시장에 적당한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기존에 인수한 계열사들을 키우는데 힘을 싣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우리종합금융에 1천억 원, 올해 3월 우리금융저축은행에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비은행 계열사에 자본투입을 늘려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6일 2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 손 회장이 추가로 비은행 계열사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금융지주가 얼마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우리금융캐피탈은 유상증자 필요성이 높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레버리지)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캐피털사의 레버리지비율 상한을 기존 10배에서 9배로 축소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상반기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 9.2배를 보였다.
우리금융캐피탈이 그룹 계열사와 시너지를 본격화해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어 총자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확충을 통해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셈이다.
손 회장은 8월부터 9월 말까지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 자회사 3곳을 강남타워 신사옥으로 통합이전하며 그룹 시너지를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자금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이자이익이 늘어 연말까지 실적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실적 부담을 덜고 비은행부문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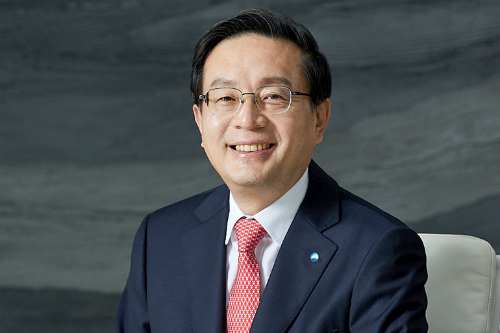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3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의 3분기 예상 순이익은 7160억 원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좋은 실적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며 "이자이익 증가가 성장을 지속 견인하는 가운데 대손비용과 판관비 부담이 낮게 유지되며 고수익성 시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효과와 가계대출 억제조치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효과 등이 맞물리며 은행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금리인상 효과에 따른 실적 증가효과를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은행 순이익 기여도는 80%를 넘어선다. 경쟁 금융지주들의 은행 순이익 기여도가 55~65%대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다만 은행의 순이익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금리상승시기에는 강점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구조상 약점으로 꼽힌다.
손 회장은 이를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상황에서 톡톡히 겪었다.
코로나19 상황에 저금리기조가 이어져 이자이익은 감소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해 대손충당금 규모는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지주는 증권 등 비은행계열사를 통해 실적 증가세를 이끌었다.
2019년 대비 2020년 금융지주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하나금융지주는 10.3%, KB금융지주는 4.33%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신한금융지주도 0.3% 늘어나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반면 우리금융지주는 유일하게 순이익이 30% 줄었다. 비은행부문이 부족한 탓이다.
손 회장이 지속해서 우리금융지주의 비은행부문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다. 손 회장은 5일 자회사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기존 비은행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비은행부문을 그룹의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자"고 말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이자이익 증가로 당분간 실적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최우선 과제인 비은행부문 강화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기존에 인수한 계열사들을 금융지주 수준으로 덩치를 키우고 비어있는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메우는 두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인수합병은 시장에 적당한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기존에 인수한 계열사들을 키우는데 힘을 싣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우리종합금융에 1천억 원, 올해 3월 우리금융저축은행에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비은행 계열사에 자본투입을 늘려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6일 2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 손 회장이 추가로 비은행 계열사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금융지주가 얼마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우리금융캐피탈은 유상증자 필요성이 높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레버리지)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캐피털사의 레버리지비율 상한을 기존 10배에서 9배로 축소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상반기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 9.2배를 보였다.
우리금융캐피탈이 그룹 계열사와 시너지를 본격화해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어 총자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확충을 통해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셈이다.
손 회장은 8월부터 9월 말까지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 자회사 3곳을 강남타워 신사옥으로 통합이전하며 그룹 시너지를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자금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